▣ 경주 불국사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 경주 불국사 경내 [ 慶州 佛國寺 境內 ]
경북 경주시 진현동[進峴洞]에 있는 불국사, 임야 등을 포함한 일원 면적 38.82ha에.
불국사 창건설화[創建說話]에는 재상[宰相] 김대성[金大城]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현생[現生]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石佛寺]를 지었다고 한다. 이 절들은 토함산 유적의 쌍벽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535년[법흥왕 22] 왕모[王母] 영제부인의 건의로 세웠다고 하나, 당시의
규모는 명확하지 않다. 751년(경덕왕 10) 김대성이 크게 중창하여 규모를 새롭게
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774년(혜공왕 10)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따르면, 당시의 전당[殿堂], 문루, 낭곽[廊廓],
실료[室寮], 석조물 등이 90여 기[基]에 이르렀다. 이 웅대한 규모의 대가람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전화로 거의 없어졌고, 종전의 목조전당 들은
l659년[효종 10] 그 일부가 재건된 것이며, 1972년 대복원 사업으로 무설전[無說殿],
관서전[觀書殿],각 회랑 등이 새로 세워졌다. 청운교[靑雲橋], 백운교와 칠보[七寶],
연화교[蓮花橋]라 일컫는 동, 서 석교[石橋]와 그 사이를 잇는 대석단[大石壇],
범영루[泛影樓]를 받친 석주와 석축, 각 전당의 기단과 다보[多寶], 석가, 쌍탑 등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다.
1963년 3월 28일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된 후 2009년 12월 21일 지정해제와
함께 '사적'으로 재분류되어 현재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로 등록되어 있다.
참조항목 : 불국사, 불국사고금역대기
역참조항목 : 김대성,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불국동
출처 : 두산백과


|
|

△. 연화교[蓮花橋]. 칠보교[七寶橋] 국보 제22호
연화교, 칠보교의 양식은 청운교, 백운교와 같으며 다소 규모가 작을 뿐이다.
연꽃잎이 새겨진 아래쪽의 계단이 연화교이고 위쪽이 칠보교이다.
이 계단을 거쳐 안양문에 오르고 안양문을 통과하면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인 극락전 영역에 이르게 된다.
오르는 계단 하나하나에 조각된 활짝 핀 연꽃은 불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향기롭게 한다.
|
|

△. 경주 불국사에서는 안양문 앞에 있는 계단식 교각이 있는대
세속 사람들이 밟는 다리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의 깨달은 사람만이 오르내리던 다리라고 전해진다.
전채 18계단으로 아래는 연화교 10단으로 되있고 위에는 칠보교로 8단으로 놓여있다.
연화교의 높이는 2.3m, 너비는 1.48m, 칠보교는 높이 4.06m, 버비 1.16m이다.
동쪽에 있는 백운교와 청운교의 웅장한멋을 보여주지만 섬세한 아름다운을 내보이고 있어.
불국사의 조형에 조화와 변화를 보여주는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10년[751]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
|

△. 안양문[安養門]
안양문은 아랫 쪽의 연화교와 윗쪽의 칠보교로 되어 있습니다.
연화교, 칠보교를 내려다보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연화무늬를 볼 수 있는데,
선인들은 연꽃 향기 가득한 계단을 올라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
|

△. 범영루[泛影樓] 안내문을 살펴본다.
지금은 법고[法鼓]가 있으나 원래는 범종각[梵鐘閣]임, 751년에 세워졌다.
여러차례의 중수[重修]와 중건[重建]을 거쳐 1973년, 불국사 복원[復元]때 옛 모습대로 다시 세웠다.
기단[基壇]의 돌기둥은 수미산[須彌山]을 본뜬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수미범종각[須彌梵鐘閣]이라고도 한다.
수미산[須彌山] : 須[모름지기 수] 彌[두루 미] 山[뫼 산] 이라는 뜻이다.
|
|

△. 범영루[泛影樓]
청운교, 백운교를 올려다 보면서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범영루[泛影樓]이다.
원래 이 종각의 이름은 수미범종각[須彌梵鐘閣]으로 수미산[須彌山] 모양의 8각 정상에 누각을 지어
그 위에 108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로는 오장간[五丈竿:50자 높이의 칸]을 세울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범영루는 751년에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에 의하여 불탄 것을 조선시대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가,
1973년 복원공사 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된 것이다. 지금도 남아 있는 범영루 아래의 석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다.
즉, 석단위에 판석[板石]을 세웠는데, 밑부분을 넓게 하고, 중간 돌기둥을 지나면 다시 가늘고 좁게 하였다가
윗부분에 이르러 다시 밑부분과 같이 넓게 쌓았다. 쌓은 형태는 기둥돌이 전부 8개씩 다른 돌로 되어 있고,
이 다른돌을 동서남북의 네 방향으로 조립한 것으로서 대단히 독특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수미범종각을 받들기 위하여 고안된 의미있는 형상이라고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그 상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석주 사이의 공간은 항아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안상[眼像] 같이도 보여 수미범종각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 상징을 알아내기 위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래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건축자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내지는 못했다. 지금의 범영루는 본래의 모습보다는 훨씬 축소한 형태로 보여지고,
그 이름도 누각의 그림자가 청운, 백운교 아래 있었던 구품연지[九品蓮池]에 어린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며,
현재 이곳에는 돌거북 조각위에 세워진 북이 있다.
|
|

△. 파란색 으로 덮어 놓은곳이 아마도 보여지로 "구품연지" 는 곳으로,
정보에 의하면 위에 있는 칠보교 백운교가 불을 끌어 들이는 역활을 하였다면
연화교와 청운교는 연지않에 들어 있어 운치를 만들어 내던곳으로 보여집니다...
|
|

△. 당간지주[幢竿支柱]
불국사 앞쪽 마당에 위치하고 있다. 2매 1조의 형태로 서 있는 당간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
당간지주는 불보살의 공덕이나 역사적 목적으로 기를 달 때 깃대를 고정시키는 기둥역할을 하였다고 전한다.
중간부에 한 단의 턱을 지어 변화를 주고 있다. 정상부는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안쪽에 간구가 마련되어 있다.
간대석은 별다른 장식 없이 지름 45㎝ 크기의 얕은 원공을 표현하고 있다.
|
|

△. 자하문[紫霞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건물.
대웅전 앞 중문[中門]으로서 앞에는 국보 제23호인 청운교[靑雲橋]와 백운교[白雲橋]가 있고,
이를 오르면 넓은 석조기단 위에 인 이 문이 세워져 있다.
문의 양옆에는 1973년에 복원한 남회랑[南回廊]이 연결되어 있다.
건물 가운데 달린 판문의 바깥쪽에는 갓기둥의 간격에 맞추어 계단참 형식의 공간을 두었고,
문 안쪽에는 기둥 간격보다 넓게 기단을 마련하여 주춧돌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기둥은 조선 후기식 민흘림 수법으로 처리하였고, 기둥 윗몸에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두르고,
이 위에 안팎 2출목[二出目]인 다포계[多包系]의 공포[栱包]를 짜올렸다.
한편, 기단의 주춧돌·신방석·문지방돌 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건립연대는 불분명하지만, ≪불국사고금창기 佛國寺古今創記≫에 의하면,
1436년[세종 18]에 중수된 적이 있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28년[인조 6]에 재건하였다.
그 뒤 1630년에 수리를 하고 1708년(숙종 34)에 단청을 하였다고 한다.
또 1966년에 이 건물을 수리할 때 발견한 상량문에 의하면, 1781년[정조 5]에 다시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 자하문[紫霞門]
자하문은 750년 경에 세워졌다. 그 후, 여러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쳐 1966년 크게 보수하였다 하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 자하문을 들어서면 그 곳으로부터 대웅전을 비롯한 불국토가 전개된다.
이름을 자하[紫霞. 붉은노을]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광명을 형용한 것이다.
|
|

△. 청운교 백운교불국사 예배공간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오르는 계단으로
서쪽을 연화교, 칠보교는 극락너으로 연결되고 동쪼에 있는 청운교, 백운교는 대웅전을 항해 자하문과 연결된다.
청운교와, 백운교는 아래에 있는 청운교[靑雲橋] 속세와 다리 위의 부처님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다리로
계단은 17단이며 높이 3.82m 너비 5.14m이며,
위에 있는 백운교白雲橋]는 16계단으며 높이는 315m 너미는 5.09m이다.
전채 33게단으로 33숫자는 불교에서 아직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 서른세가지의 단게를 말한다,
여기서 청운교는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는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상징한다.
|
|

△. 좌경루[左經樓]
대웅전의 남쪽 회랑 동쪽과 서쪽 끝에 각각 경루와 범영루가 위치하고 있다.
남쪽 회랑의 양쪽 끝에 돌출하여 대칭으로 위치한 건물이다.
범영루와 좌경루의 석조기단은 김대성에 의해 불국사가 창건될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범영루의 기단은 석재를 '十'자형으로 짜 만들었는데,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제4단까지는 호형[弧形]을 이루며 좁아들다가 제5단부터 점차 넓어지는 형태인데,
제5단 이상의 석재 끝에는 공포의 살미에 베푸는 듯한 조각을 베풀어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좌경루의 기단은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다.
전체가 석조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래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뒤 공포를 짠 목조건축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기둥은 팔각이고, 기둥 위에는 공포처럼 '十'자로 짠 석재를 두 단 놓았다. 내부에는 목어[木魚]가 있다.
|
|

△.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국보 제23호
범영루와 좌경루가 솟아있는 석축 중앙에 쭉 힘차게 내뻗은 계단이 있다.
위쪽의 16계단이 백운교 이며,아래쪽의 17계단이 청운교이다. 청운교 밑에는 무지개처럼 둥근 들보 모양으로
만들어진 홍예문이 있다. 지나치게 고요하고 안정된 긴 석축에 둥근 곡선으로 변화를 일으켜 생동하는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원래 석축 아래에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단 왼쪽에 토함산의 물을 끌어들여 연못으로 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는 물보라에 무지개가 떴다고 한다. 못 위에 놓인 청운교 백운교와 연화교 칠보교, 긴회랑과 경루, 종루 등 높은 누각들이
거꾸로 물 위에 비쳐 절경을 이루었을 것이다. 국보 제23호 청운교. 백운교 전경 청운교 백운교 계단을 올라서면 자하문이다.
자하문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피안 세계세계인 대웅전 영역으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부처님의 몸을 자금광신이라고도
하는데 자하문이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자주빛 금색이 안개처럼 서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문을 통과하면 세속의 무지와 속박을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한편 자하문에서 내려다보면 범영루와 좌경루를 받들고 있는 주춧돌이 보인다. 특히 범영루의 주춧돌은 특이하게 쌓여있다.
주춧돌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기 8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는데 밑부분을 넓게 하고 중간에는 가늘고 좁게 하였다가
다시 밑부분과 같이 넓게 쌓았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아무데서나 찾아볼 수 없으며, 모방할 수 없는 신라 특유의 슬기이다.
|
|

△. 불국사 기념품 판매소 한번씩 모두 들러 보는것 같아 보였으며
이렇게 불국사 자하문을 바라보니 좌측편에 구품연지가 복원되었다면 아름다운 운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
|

△. 구품연지[九品蓮池]
불교 사찰안에 있는 인공 연못으로서 극락정토에 있다는 큰 연못을 모방해 만든 것.
이승에서의 공덕에 따라 9단계를 주고 극락정토에가서 연꽃대에 앉을때 그 단계별로 자리배치를 받는다 한다.
사진상에 보시면 자하문 청운교, 백운교와 범영루 사이에 석축 사이에 불국사 경내에서 물이 나오는 하수구 같아 보이는 곳에.
물을 끌어들여 물이 떨어 지는 부분에 인공연못을 만들어 그연못에 관한 설화도 많이 있었으며
지금은 소나무 있는 부분이라 발굴작업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

△. 불국사 입구 안내소 이곳은 문화 해설사분들도 이곳에 있었지만..
너무자주 물어 오는 말이라 이렇게 사전에 적어 놓았더군요...
불국사를 찾을 대는 이렇것들은 알고 들어가야 할것 가았습니다...
|
|

△. 구품연지에 관하여 알게되어 혹시나 작은 연못이 하나 보여 돌아가 보게된다.
|
|

△. 연못에 수분이 많아 단풍색도 짙어 보이며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
|

△. 연못을 바라보니 바로 불국사 천왕문지나 경내로 들어가기전에 마나는 다리 "해탈교" 입니다.
연못에도 비단잉어와 잉어가 평화롭게 노릴고 있더군요,
지금부터는 불국사 후문 격인 불이문 으로 나가 볼렵니다.
|
|

△.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단풍길이 너무 아름다워,
지나는 사람모두가 사진을 담는다고 자리잡아 저는 이렇게 밖에 담을수 없었다.
|
|

△. 불이문길은 아마도 번뇌를 벋기위해 찾는이에게는 ..
여기서 부터 마음을 다스리게 될것이다.
|
|

△. 불국사 사리매[佛國寺 舍利梅]
백매[흰색꽃 매화]로 수령은약90년 1974년 범행스님이 식재 [당시 주지스님]
2007년 고사된 부분을 사리로 조각하였다 한다.
|
|

△. 불국사의 모든 경내를 둘러보고 나가는 마음 부처님의 세계를 알수 있을것도 같으면서,,
아직도 찾지못한 피안의 세게를 아마도 다시 찾아야 할것 같다.
|
|

△. 내려오는길 화려함으로 마음까지 편안함을 주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움을 느겨진다.
|
|

△. 이탑은 어떤 의미일까...??
어던분의 께달음인지 알수없었지만 나름은 이곳까지 모두 알아 버렸다면 다시는 불국사를 찾않을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어든다. 그때 까지는 알수 없없을것 같다...
|
|

△. 이잰 불이문을 나섭니다..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라 표현 할수 밖에 없었던 불국사의 진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세계를 좀더 배울수밖에 없는 현실을 배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잰가는 다시 찾는 그날까지는 높은 경지에 올라 다시찾을대는 또다른 세게가 보일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

△. 이잰 불국사 주차장을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마음을 정리 하며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 주류는 없었지만 아주머니가 끊여준 커피 한잔으로
경주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곳까지 따라 오시면서 읽어 주신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건강하셔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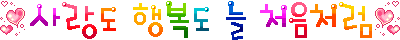 도 아름 도 아름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