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촌 황희 선생 영당지 [厖村 黃喜 先生 影堂址]

○ 방촌 황희 선생 영당지 [厖村 黃喜 先生 影堂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조선 초기의 유적지.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이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맛배집으로, 조선 세종 때의 문신 황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그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영당을 비롯하여 영모재[影慕齋],반구정[伴鷗亭],앙지대[仰止臺] 등이 세워져 있다.
이 영당은 1455년[세조 1]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의 건물은 1950년 6·25 때
불탄 것을 그해에 복원한 것이다. 영당 내부에는 약 100여년 전에 모사 되었다고
하는 황희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돌담장을 둘러 구획한 경내의 초입은 솟을삼문이 서 있고, 뜰을 지나면 화강석재의
장대석을 2단으로 짠 기단 위에 영당이 서 있는데 처마 밑에는 선생의 호를 딴
"厖村 先生 影堂 [방촌 선생 영당)]" 란 당호가 행서로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앞쪽은 기둥만을 나열한 트인 공간이며, 후면에는 문짝을 달고 내실을
마련하여 그 안에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건물의 외부에는 단청이 장식되고 측면에는
방풍널을 드리웠다.
그리고 영당의 왼편에는 황희의 15대 외손인 맹현[孟鉉]의 사당이 있으며,
오른편에는 이곳을 방문하던 빈객을 영접하여 침식을 제공하던 영모재가 있다.
건너편에는 황희가 벼슬을 떠나 여생을 보내던 반구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역시 6·25 때 불탄 것을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 말발굽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을 잊어버렸다. [아는사람 알려주셔요..] 문고리라고 하던대..
|
|

△. 정문 들어서면서 제일먼져 접하게되는 안내문
|
|

△. 마당은 넒어 보이며 자연 스러운 옛 가옥같은 첫느낌을 준다...
|
|

△. 황희선생 영당 [黃喜先生 影堂] 입구 안내판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이 곳은 조선초기[朝鮮初期]의 명상[名相]이며 청백리[淸白吏]의 대표적인 황희[1363~1452]선생의 유업[遺業]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곳으로 방촌영당[厖村 影堂], 경모재[景募齋], 반구정[伴鷗亭], 양지대[仰止臺]가 있다.
황희 선생은 조선조의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문물과[文物]과 제도[制度]의 정비에 노력하였고,
세종대[世宗代]에는 영의정[領義政]이 되어 세종을 도와 훌륭한 업적을 남기었다.
이 영당은 6.25사변으로 전소[全燒]된 것을 1962년 후손들이 북원[復元]하였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인
초익공양식[初翼工樣式]의 맞배지붕에 단청[丹靑]이 되어 있고 솟울삼문이 있다.
|
|

△. 방촌 기념관 입니다... 정문 들어가면서 우축으로 있는곳
|
|

△. 정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축으로는 영당지 들어가는 청정문[靑政門] 좌축으로는 방촌기념관이 있지요..
|
|

△. 청정문[靑政門]을 들어가 영당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고직사[안내문 에는..] 입니다. 그런대 들어어가 보면 다른 이름이 있다.
|
|

△. 고직사 들어가 보겠습니다...[엥~~ 문이 걸려있다.]
|
|

△. 입구 현판에는 "고직사" 라고 되있는대 입구 문에 들어오니 사직재[舍直齋]라고 써져있다.
|
|

△. 다시 원위치로...좌축부터 고직사, 월헌사, 방촌 황희선생 영당, 입니다.
|
|

△. 넒은 운동장 같아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
|

△. 경모재[景募齋] 방향이며 그옆으로는 황희선생의 동상도 있는 곳입니다..
차근차근 돌아 보겠습니다....
|
|

△. 먼저 월헌사와 황희선생 영당지로 올라갑니다..
|
|

△. 월헌사[月軒祠] 입구 안내판을 읽어 보겠습니다.
소양공 월헌 선생 부조묘[昭襄公 月軒 先生 不祧廟]
선생의 휘[諱]는 맹현[孟獻], 자[子]는 노경[魯卿], 호[號]는 월헌[月軒]이고, 영의정 방촌선생[嶺義政 厖村先生]의 현손[玄孫]이다.
서기 1472년 성종[成宗] 임진[壬辰]에 출생[出生]하시고 1498년[연산,燕山 4년] 무오[戊午]에 급제등과[及第登科]하시였다.
1506년[중종, 中宗 元年 丙寅]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공[功]을 세워 분의정국[奮義靖國] 공신[功臣]으로 책봉[冊封]되었다.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예조[禮曹], 참판[參判] 및 강원[江原],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를 역임[歷任]하셨다.
1524년 중종[中宗] 19년 갑신 장원군[甲申長原君]으로 책봉[冊封]되시고, 예조판서[禮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歷任]하셨다. 1535년 중종[中宗] 30년 을미[乙未] 10월 9일 64세로 서거[逝去]하셨다.
1566년 명종[明宗] 21년 병인[丙寅] 증[贈] 시[諡] 소양[昭襄]으로 명사[命賜]하시고 부조묘로[不眺廟]로 봉안[奉安]되셨다.
월헌선생 : 방촌 황희 선생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
|

△. 월헌사[月軒祠]
이곳을 들어가 보고 싶었는대 대문을 현대식 열쇠로 잠겨 놓았더군요,,,
울타리 넘어 현판만 담아 보았습니다. 《祠 : 사당사》
※ 부조묘[不祧廟] 란
부조묘는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다.
예부터 종갓집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위로 4대에 해당하는 선조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제사를 모시던 자가 죽은 경우인데, 죽은 후 그 후손은 뒤를 이어 제사를 모실 때 죽은 이를 포함하여 선조 3대를 모시게 된다.
이때 기존에 모시던 가장 위의 선대의 제사는 지내지 않게 되고, 이 경우 그 선조의 신위를 사당에서 꺼내 땅에 묻는 것이 예의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왕의 허락 아래 신위와 제사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부조묘라 한다. 주로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왕들은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인물이라 여겨지면 신위를 옮기지 않도록 허락하였다.
이렇게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 대상들은 4대 봉사가 끝난 후에도 신주를 땅에 묻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기제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출처 : 한국학 중 연구원
|
|

△. 황희선생 영당지 [黃喜先生 影堂地] 안내문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127
조선초기[朝鮮初期]의 명재상[名齋相]이며 청백리[淸白吏]의 귀감인 방촌 황희[1363~1452]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황희는 고려 우왕2년[1376]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공영왕 1년[1389]문과에 급제하였다.
태조 1년[1392]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으나, 태조 3년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에 의해 조선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세종 13년[1431] 영의정이 되어 18년간 세종과 함께 국정을 다스려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로를 세웠다.
분래의 영당은 6.25전쟁 때 전부 불탔으나, 1962년 후손들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있다. 영당 내부에는 중앙에 별도로 감실을 두고 그안에 영정을 모셨다.
|
|

△. 방촌선생영당 황희선생 영당지 [黃喜先生 影堂地]
|
|

△. 내부에는 황희선생 영정이 모셔져 있다.
|
|

△. 황희선생 영당지 [黃喜先生 影堂地] 옆에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서있었다....
|
|

△. 그옆으로 경모재[景募齋]로 자리를 옯겨봅니다...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또한 세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
|

△. 경모재[景募齋]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

△. 경모재[景募齋] 앞 마루 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란 글씨가 있어 맨발로 올라오니
고향집에 온듯한 느낌을 준다.
|
|

△. 경모재[景募齋]추녀 밑으로는 말발굽처럼 닮았다는 문고리가 있어 더욱더 풍류를 더해준다.
|
|

△. 경모재[景募齋]라는 편액이 붙여져있다.
|
|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觀風樓 [관풍루]
軒高能却署[헌고능각서] 집이 높으니 능히 더위를 물리치고
簽豁易爲風[첨활이위풍] 처마가 넓으니 바람이 통하기 쉽네.
老樹陰垂地[노수음수지] 큰 나무는 땅에 그늘을 만들고
岑翠掃空[요잠취소공] 먼 산봉우리는 푸르게 하늘을 쓰는 것 같네.
방촌 선생이 세종 5년(1423) 감사 재직 시 남긴 유묵(생전에 선생이 남긴 글씨나 그림)으로
유적지 내 방촌선생 동상 좌대에 음각되어 있다.
|
|

△. 동상 우축에 있는 1978년 5월 동상을 세우며
기념비도 함께 세워졌다.
|
|

△. 동상 건립하며 들어간 비용과 건립에 공을 들이 사람들 등등 적어놓은 비로 보인다..
|
|

△. 황희선생 동상앞에서 양지대로 올라가는길입니다.
올라가 봅니다..
|
|

△. 올라가며 뒤돌아 동상있는 방향으로 바라본다,
|
|

△. 어른의 높고 맑은 뜻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앙지대 [仰止臺]
반구정에서 남쪽으로 바로 이어진 등성이 위쪽에는 또 하나의 정자가 멋드러지게 서 있는데,
그 곳까지 층계가 나 있다. 정자의 크기는 반구정보다 작고 6각형인데, 이름하여 앙지대[仰止臺]이다.
이 정자는 1455년[세조 원년]에 유림들이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여 영당(影堂)을 짓고 영정을 봉안할 때 함께 지은 것이다.
앙지[仰止]는 앙지[仰之]로도 쓰는데, 시경[詩經] 소아[小雅]에서
높은 산을 우러러 받들듯이 [高山仰止]
넓게 트인 길 우리 따르리 [景行行止]
에서 따라 지은 것으로, 후생들도 이 어른의 높고 맑은 뜻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자 내부에는 1973년 3월에 이은상이 쓴 중건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후손이 쓴 현판시가 하나 걸려 있다.
정자는 단청도 화려하고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곳이 5백여년 전에 방촌이 소일하던 곳이라 한다.
더욱이 눈 아래에 흐르는 임진강을 바라보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
|

△. 반구정[伴鷗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반구정은 황희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이다.
임진강 기슭에 세워진 정자로 낙하진에 인접해 있어 원래 낙하정(落河亭)이라 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를 추모하는 8도의 유림들이 유적지로 수호하여 내려왔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다. 1967년 개축을 하고 1975년에는 단청과 축대를 손보았다.
그 후 1998년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반구정과 앙지대 등을 목조건물로 새롭게 개축하였다.
|
|

△. 앙지대[仰止臺]
앙지대는 반구정이 원래 위치했던 자리이다. 1915년 반구정을 현 위치에 옮겨 지으면서
그 자리에 황희선생의 유덕을 우러르는 마음을 담아 육각정을 짓고, 앙지대라 이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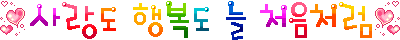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