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시대 대운대사 창건한 정암사
|

○ 홍성 정암사 [ 洪城淨岩寺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에 있는 사찰.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의 오서산[烏棲山] 북사면의 중턱에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사찰조에는
"정암사는 오서산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원래의 사찰은 폐사되고
1976년에 옛 절터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새 사찰을 중창하였다.
옛 사찰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금당지에는 자연석으로 된
사각형의 초석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현재 정암사는 "ㅁ"자형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양쪽 옆면과 앞쪽에 요사채를 두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 홍성 정암사 부도 [ 洪城淨岩寺浮屠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의 정암사[淨岩寺]에 있는 부도이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으나 정암사로 옮겨져 보수되었다.
부도는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모두 갖춰진 상태지만 기단부는
원래의 것이 아니다. 기단부는 복련[伏蓮:꽃잎이 밑을 향한 연꽃무늬]이
새겨진 8각형의 대좌 위에 사각형의 대석을 올려놓았다. 탑신[塔身]은
직경 25cm, 높이 45cm의 타원형으로 아무런 장식도 없다.
옥개석은 날개지붕, 보주[寶珠], 연봉[蓮峯]을 1매의 돌로 표현하였다.

▲ 홍성 정암사 [洪城 淨岩寺]


|
|
◎ 사진으로 본 산행기

△. 만추로 인한 정암사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창고로 보이면 한쪽에는 해우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
|

△. 오서산 산행길에 상담마을 방향으로 하산하며 만나게 되는 정암사
일주문격인 범종루를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만나게 된다.
|
|

△. 오서산 정암사[烏捿山 淨巖寺]
들어가는 입구쪽으로는 "오서산 정암사[烏棲山]"라 사액[寺額] 되있었으며..
뒷편으로는 나오면서 바라보면 "범종루[梵鐘樓]"라 사액[寺額] 되있었다.
일각에서는 "조루산 정암사[鳥樓山 淨巖寺]"라고도 하던대 어떤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
|

△. 범종루[梵鐘樓]
2층의 누각[樓閣]으로 되어 있을 때는 범종루라 하고, 불전사물 가운데 범종만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범종각이라고 한다.
이곳에 비치되는 사물은 모두 부처님에게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불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예불과 사시공양[巳時供養], 저녁예불 때에 사용된다.
이들은 소리로써 불음[佛音]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범종은 청정한 불사[佛寺]에서 쓰이는 맑은 소리의 종이라는 뜻이지만 지옥의 중생을 향하여 불음을 전파하고,
홍고는 축생의 무리를 향하여, 운판은 허공을 나는 생명을 향하여,
목어는 수중의 어류를 향하여 소리를 내보낸다는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이 사물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찰이라도 범종만은 반드시 비치하게 된다.
이 당우는 산문[山門]을 들어서서 좌측 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범종루 편액[梵鐘樓 扁額]
범종루의 뒤쪽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범종루[梵鐘樓]"라고 적혀 있습니다.
범[梵]이란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의미로 범종은 이런 우주의 소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이 소리를 듣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

△. 단칸 누각식의 종루에는 1991년에 조성한 범종이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니 단풍과 함께 사진을 담으며 친근감을 주는것이 아늑함까지 준다.
|
|

△. 범종루로 다가가니 이렇게 한쪽옆으로는 등산로가 이정표와 함게 서있어
정암사에서는 조금은 않어울려보인다....
|
|

△. 범종루를 밑으로 들어서면서 머리위로 보이는 그림..
일주문에는 산천왕상이 있어야 하는대 선녀상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찾는이를 반기는 인상을 주는군요..
중앙에 구명은 범종울림 구명으로 보이더군요...
|
|

△. 정암사 들어서면서 먼저 보이는 약수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긴 하나
그리 보이지는 않는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먼저 범종루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
|

△. 범종루에 올라 먼져 지난온 창고와 해우소 방향을 바라보니
그곳에 단풍이 아름다워 눈길이 끌리는것 같습니다..
|
|

△. 범종루에서 바라본 정암사 극락전 앞마당 그리 넒은터는 아닌듯합니다..
|
|

△. 범종 사이로 보이는 좌축으로 신검당 지금은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앞에 보이는 사리탑 얼마전에 탑사된듯해 보인다..
|
|

△. 범종루 사이로 극락전과 산신각을 바라봅니다..
계곡이 아늑하여 사찰로써는 작은 공간이지만 사찰로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
|

△. 범종루 범종[梵鐘樓 梵鐘]
이재는 범종루를 담아 봅니다..
범종의 장엄한 소리는 중생을 착한 길로 인도하며 해탈의 길로 승화시켜 준다고하는 의식구입니다.
또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항아리 모양의 종신부[鐘身部]에 보상당초문이 새겨진 상하대[上下帶]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4개의 유곽[乳廓]을 두르고 그 안에 9개의 유두[乳頭]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대 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공양상과 당좌[幢座]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종의 꼭대기에는 굵은 음통과 종을 입에 물고있는 용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범종은 1991년도에 만드러졌다고 한다.
|
|

△. 산신각[山神閣]
한국의 불교사찰에 있는 산신각은 고유신앙의 수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민간의 신앙이 두터운 칠성[七星]도 같이 모셔졌다.
그 명칭은 산신각·칠성각[七星閣]·삼성각[三聖閣] 등 일정하지 않다.
현재 불교에서는 산신을 가람수호신과 산 속 생활의 평온을 지켜주는 외호신[外護神]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대부분의 사찰에는 산신각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신신기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산신각은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을 모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殿]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각[閣]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 특유의 전각 가운데 하나로 한국 불교의 토착화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

△. 산신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축으로보이는 장독대와 그뒤로는 게단이 보이는대 그곳으로 올라가면 부도가 있으며
요사체로도 가는길이 있다.
|
|

△. 산신각 앞마당에 올라와 극락전 앞에있는 사리탑을 바라본다...
멀리는 서해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사찰로써의 터가 정겹게 보이도도 하면 편안함을 주는것 같다...
|
|

△. 산신각에 올라오니 문을 열어놓아 내부에 산신탱화를 볼수있어 사진을 담아본다.
|
|

△. 정암사에서는 산신을 잘 모셔온듯합니다..
정겹게도 보이는 산신령과 호랑이상이 있는 산신탱화 우리의 문화가 불교문화와 화합된듯하여 보여진다.
|
|

△. 잘 정리된 장독대를 보니 그 장맛 또한 좋을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
|

△. 오늘의 풍경속에서 정암사의 단풍으로 감싸인 풍경이 아름다워
눈길을 멈추게만 합니다..
|
|

△. 추녀끝에 메달린 풍경소리 딩~동.. 울리며 어디선가 들릴듯한 보정스님의 기침소리
정암사에서의 깨달음을 주는듯합니다... 보정스님은 정암사 주지스님 이다.
|
|

△. 정암사 극락전앞에서 바라본 앞마당
좌축으로는 요사와. 범종루. 가운대는 사리탑. 공덕비 공사로 어수선해 보인다.
|
|

△. 극락전은 비바람에 문을 닫아놓아 빼꼼히 문열어 부처님 사진을 담아 보았지요 [아래 나옵니다..]
오름 계단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여 있으면서 극락 세상의 화려함을 알려주는것 같습니다...
|
|

△. 사리탑과 공적비
정암사는 백제성왕 5년 담욱[曇旭]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불기2532 충남 전통사찰 68호로 지정되었다.
[여지도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결성현[사찰조]와[산천조]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이 - 송시열 - 권상하로 이어
지는 기호성리학의 거두 남당한원진의 학처[學處]이기도 하다.
오서산[烏棲山]의 오[烏]는 삼족오를 뜻하며, 태양. 산악숭배를 했던 백제인들의 신앙처로서, 당나라 지리서 [환원]의
[백제전]에 계룡산과 함께 기록되어있다. 이후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천제[天祭]를 올렸으며, 백제부흥
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오성산[烏聖山]으로도 불리며, 지역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오고 있다.
불기2556년 석가탄신일에 주지 장보정은 적묵닥을 이전한자리에 탑을 조성하고 스리랑카로부터 진신사리 5과를 모셔와 봉안 하였다.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 역대 조사와 정암사 창건이후 1500년을 지켜온 선지식들의 깊은 신심에 감사드리며, 중창불사와
진신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의 노고를 글로 새겨 그 공덕을 높이 기리는 바이다.
- 공덕비 내용중에서 -
|
|

△. 극락전[極樂殿]
1976년에 중창하였으며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다포형식을 하고 팔작지붕을 한 목조 기와집이다.
내부에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소형 관음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탱화로는 근작으로 추정되는 후불탱화를 비롯하여 전부 5점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극락전 편액[極樂殿 扁額]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들의 왕생 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법당입니다.
<미타3부경[彌陀三部經=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찰에 따라서는 "무량수전無量壽殿]", "수광전[壽光殿]"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수명장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무량수불을 모시지만, 아미타불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

△. 아미타삼존불의 오른쪽 앞에 따로 모셔져있는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으로 개금을 하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반개한 눈은 자비로우며, 머리에는 불꽃모양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양 어깨를 덮은 천의[天衣] 주름은 유연하게 잘 처리되어 있으며,
배부근에는 띠매듭이 보입니다.
결가부좌한 다리의 무릎 폭은 넓으나, 넓이가 좁아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양 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습니다.
|
|

△. 극락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중턱에 자리한 정암사의 창건과 연혁을 전하는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사중에서는 서기 527년[백제 성왕 5년]의 창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직 "여지도서" "결성현"조에 수록된 단편적인 기록, 즉 정암사는 오서산에 있다.
그리고 오서산은 "홍산으로 부터 백월산으로 이어져 횡으로 둘러지면서 홍주, 결성, 보령 3읍의 경계를 이룬다.
는 내용을 통해 18세기 중엽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가람고"에도 "결성현의 동쪽 28리에 정암사가 있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오서산의 정암사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들어 충청 타임즈 에서도 장암사는 고려시대 대운대사가 창건하여다는 설이 많이 나온다.
|
|

△. 이재는 정암사를 두러보고 범종루 빠져나와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
|

△. 얼마전에 오서산 억새축제 기간에 시 낭송대회도 있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들의 시들로 전시되어 있더군요.. 한참을 읽어 보았습니다..
|
|

△. 고요하고 아늑해 보이는 정암사 사찰도 시간이 말하듯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는듯 합니다...
|
|

△. 하신길에 다시금 뒤돌아 안녕을 말하기전에 담아보는 풍경 또한 아쉬움을 주는군요...
옆에 보이는 건물도 최근들어 지어진것으로 보여지며 아직도 개방 되지않아 사진으로만 담아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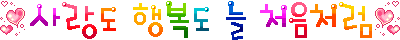
|









































댓글 영역